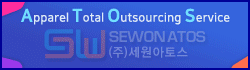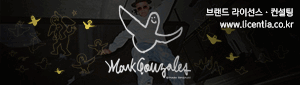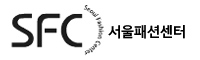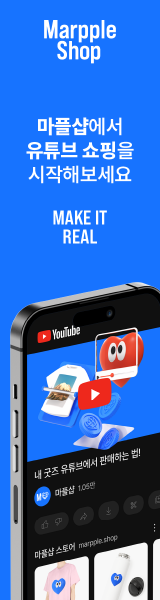
데스크 칼럼 - 존재감 잃어 가는 섬유 단체, 활력 되찾는 새해를 기대한다
발행 2019년 01월 07일
박선희기자 , sunh@apparelnews.co.kr
 [어패럴뉴스 박선희 기자]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너편에 ‘대한잠사회’ 건물이 있다. 한때 우리나라 실크산업을 이끌었던 잠사업의 본산지다. 누에고치알(잠종)에서부터 뽕나무(상묘), 제사업에 이르는 모든 단체가 이곳에 집결해 있다.
[어패럴뉴스 박선희 기자]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너편에 ‘대한잠사회’ 건물이 있다. 한때 우리나라 실크산업을 이끌었던 잠사업의 본산지다. 누에고치알(잠종)에서부터 뽕나무(상묘), 제사업에 이르는 모든 단체가 이곳에 집결해 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에서는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20~30대 젊은이들은 ‘잠사’라는 말 자체를 알지 못하는 듯하다.
잠사 혹은 실크 산업은 60년대 우리나라 수출의 중심축 역할을 했다. 가발과 생사 수출이 한해 교역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계 시장을 중국이 장악하면서 변방으로 급격히 밀려났고 지금은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동안 국내 섬유 산업의 지주 역할을 했던 메리야스(니트)연합회나 직물연합회도 지금은 존립 자체를 찾아보아야 할 정도로 규모가 작아졌다.
타월조합, 방모조합 등 한때 자체 건물을 지니고 생산단체의 기능을 했던 무수한 곳들이 유명무실하게 변해버렸다.
그렇다고 그 산업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붕괴되었다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일 것이다. 왜일까?
물론 시대가 변하면서 산업 규모가 축소되고 외세에 밀리며 그 기능성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섬유단체는 말 그대로 생산자 단체다. 회원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경우에 따라 대 정부건의나 로비도 해야 한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나 판촉에도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국내 섬유단체의 행동 반경은 지극히 관료적이고 보수적이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근 의류산업협회와 패션협회의 통합 작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미 총회를 통해 해산과 통합이 결정됐으며 오는 2월에 구체적인 골격이 발표될 것이라는 소식이다. 그러나 통합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규모를 줄인다고 해서 존립 의미가 찾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오래전 우리는 유사 단체의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업종별 섬유수출협회가 축소 조정되는 과정을 경험했다. 그 방대했던 조직이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렇다고 섬유 수출이 오그라든 것도 아니다. 형태만 변했을 뿐 규모는 도리어 커져왔다.
결국 그 이유는 단체의 기능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존립해야만 하는 당위성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우리와 가까운 일본도 수많은 섬유단체가 있고 최근 이들도 일부 통폐합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극히 제한적이고 그 경우의 수도 많지 않다. 각 단체의 기능성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단체의 조사 기능은 상당히 뛰어나다.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부 부처와도 긴밀한 보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새해 들어 시도되고 있는 의류산업협회와 패션협회의 통합이 새삼 주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외형적인 축소 이벤트가 아닌 기능성이 살아나고 창조되는 통폐합이 제대로 된 ‘헤쳐 모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저작권자 ⓒ 어패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pg)
.gif)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1 60초 숏폼, 패션 마케팅 툴 부상
- 2 거침없는 질주 ‘마르디메크르디’, 1분기 80% 신장
- 3 임가공비·원부자재 등 제조원가 지속 상승
- 4 작년 한국 명품 시장, ‘샤넬’이 ‘루이비통’ 제쳤다
- 5 런던 언더그라운드, 더현대 서울 팝업스토어 오픈
- 6 폴햄, 길고양이 공존 프로젝트 ‘코숏' 라인 출시
- 7 노이스, 일본 시부야백화점 팝업 스토어 오픈
- 8 日 플랫폼 ‘누구’, K패션 카테고리 강화
- 9 에비너 X 아이엠샵, 수원 스타필드 팝업스토어 오픈
- 10 수도권 주요 15개 백화점 여성 영캐주얼 매출
- 11 ‘스파이더’, 류현진 특수 톡톡
- 12 남성복, 2분기 총력전 편다
- 13 유닉유니온, 홈쇼핑 유통 독보적 입지
- 14 코오롱 ‘오엘오 릴레이’, 중고 거래 대표 플랫폼 부상
- 15 [신필호] 플랫폼 시대에서 브랜드 시대로의 회귀
- 16 패션플랫폼, ‘리에떼’로 MZ세대 공략
- 17 워크웨어 ‘시프트G’, 시장 안착
- 18 에이피알, 뷰티로 해외 시장 잡는다
- 19 태평양물산, ‘TP’로 사명 변경…1조 재달성 목표
- 20 영국 부츠 ‘닥터 마틴’ 매각 압력
구인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