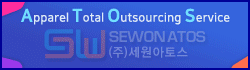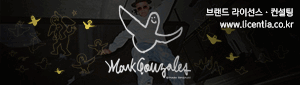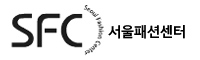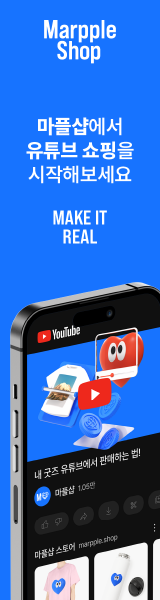
기자의 창 - 임경량기자
제 값에 팔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는 없는가
발행 2017년 01월 20일
임경량기자 , lkr@apparelnews.co.kr
|
제 값에 팔 수 있는 |
최근 한 업체의 신상품 품평회장에 갔을 때 일이다.
다가올 가을·겨울 신상품을 판매 사원에게 미리 보여줄 요량으로 모인 품평자리는 시끌벅적했던 이전과 달리 어색한 적막이 흘렀다. 이유는 겨울 외투에 사용된 오리털 양이 과하다는 사장의 호통 소리 때문이었다.
품평이 끝난 후 이 날 기자는 상품 의견서를 유심히 살펴봤다. 상품 의견서에는 판매 사원들의 의견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화근이 된 코트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메모가 달렸다. ‘반드시 진행’ 혹은 ‘大물량’ 등 이대로 만들어만 주면 판매에 자신 있다는 ‘의견’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다.
하지만 이 날 사장의 한마디 말에 해당 제품의 오리털 양은 절반으로 줄었다. 이 후 품평은 계속됐지만, 더 이상 직원들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은 없었다.
기자는 오너 중심의 혹은, 여전히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패션 업체 의사 결정 구조의 단상을 고스란히 목격한 기분이 들어 씁쓸했다.
경기 불황으로 업계에 ‘절감’이 화두가 된지 오래다. 원가 절감, 비용 절감, 인력 절감 등등. 기업 운영의 모든 요소에 이 말이 붙는다. 불황이 일상화되면서 생산 비용을 줄여 수익을 내는 일은 일종의 운명처럼 받아들여지고, 이것을 잘 해내는 사람이 승승장구한다.
기업들은 혁신적인 원가 절감으로 수익을 개선하고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 시키겠다고 말한다. 그런데 유심히 들어보면 이 말처럼 아이러니한 말도 없다.
혁신적인 원가 절감은 가능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절감을 통한 품질 향상은 쉽지 않은 게 제조업이다.
최근 업계는 통합 소싱을 놓고 다시 말들이 많다. 불확실성에 대비해 소싱을 수직 통합 혹은 수직 계열화했지만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합 소싱의 찬반을 떠나 논란의 중심에 좀 더 들어가 보자.
과거 제품 고유의 영역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들은 비용을 절약했다. 지금은 제품의 원가 절감이라는 이슈에 매몰되어 있다. 경쟁사 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맹목적 전쟁에 가깝다.
원가 절감과 경비 삭감 등 통상적인 불황 대책은 점차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전략이다. 통합 소싱의 부작용은 그 이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브랜드의 성격은 무시된 채 혹은 사업부의 요구는 무시된 채 오로지 원가 절감에 성공한 소재를 사용하는 게 의무화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적어도 유니클로같은 공산품 의류를 할 게 아니라, ‘패션’을 할 거라면 지양해야 마땅한 일인 측면이 있는 것이다.
계란이 금란인 요즘 분식집에서도 2천원짜리 라면에 계란을 빼면 손님이 줄까 싶어 무조건 넣는다고 한다.
패션 업계도 이제 제 값에 팔수 있는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선수를 틀어야 하지 않을까. 참고 견디는 대책이란, 현재 상태를 당분간 유지는 시켜 주겠지만, 미래를 향해 걸어가게 할 수는 없는 법이다.
< 저작권자 ⓒ 어패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pg)
.gif)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1 스포츠 아웃도어, 성장기 지나 성숙기 진입
- 2 이마트, 죽전점 시작으로 업태 전환 속도
- 3 룰루레몬과 리바이스...실적 거스르는 ‘희비’ 왜?
- 4 레인부츠로 대박 낸 신발 업체, 영역 확장
- 5 푸마, 백화점 등 직접 리테일 전환
- 6 김진용 전 모던웍스 대표, 퓨쳐웍스 설립
- 7 세아상역, 美 스포츠 의류 제조사 ‘테크라’ 인수
- 8 여성복, 올 여름 승부처는 ‘데님’
- 9 제강 회사가 만든 리얼 워크웨어 ‘아커드’ 런칭
- 10 롯데GFR, 패션 전문 조직 정비 완료
- 11 메디쿼터스, 320억 투자 유치…기업가치 2800억
- 12 올버즈에 대한 경고 ‘주가 1달러 이상으로 올려라’
- 13 머렐, ‘하이드로’ 필두로 신발 시장 공략
- 14 패스트리테일링 반기 실적, ‘일·중 저조, 미주·유럽이 견인’
- 15 ‘어나더오피스’ 제품력 앞세워 일본 시장 정조준
- 16 이마트-이마트에브리데이 합병
- 17 F&F, 제주 해양 폐플라스틱 의류로 재탄생
- 18 ‘판도라핏’ 오프라인 전용 PDRF 라인 전개
- 19 어센틱이 인수한 英 ‘테드 베이커’ 다시 매물로
- 20 ‘닥스 맨’, 정체성 강화
구인구직